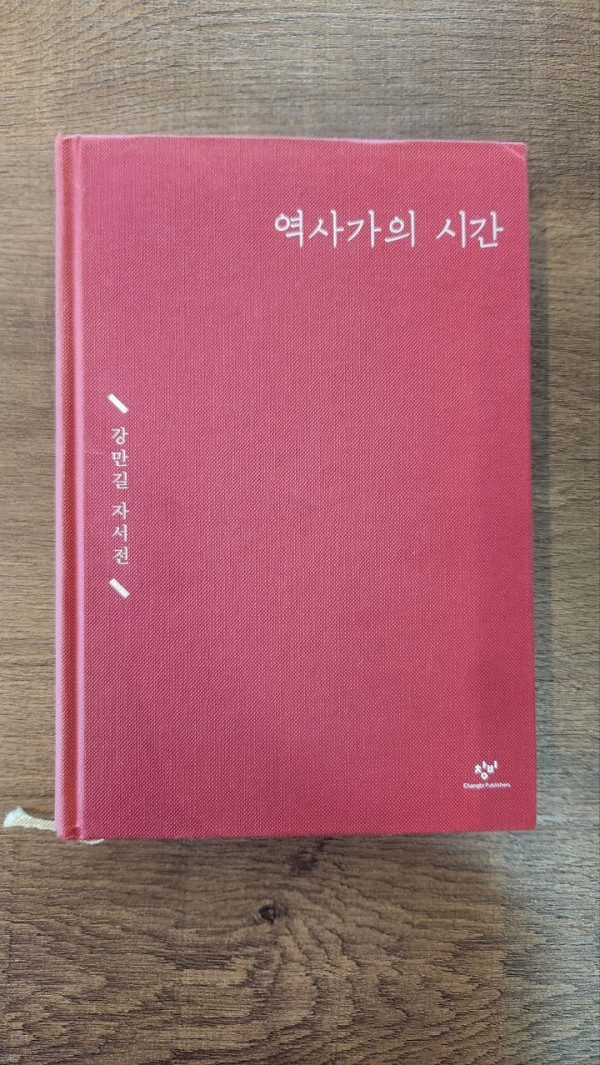문화·교육 [교차로 라이프] ‘역사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벌써 20여년이 지난 대학 시절 일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강의를 맡았던 분은 키가 껑충하니 컸고 시니컬한데다가 학원 강사처럼 강의력도 좋았다. 아마도 지금은 어느 학교에선가 자리를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성함을 잊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교수님의 전공이 조선시대사였던 것 같다. 수업의 내용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과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었다. 자칫 지루할 것도 같은 수업은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교수님의 입담으로 흥미로웠던 기억이다.
이 수업의 성적 배분은 출석 20%, 과제물 30% 나머지 50%는 기말고사 점수가 차지했다. 그런데 이색적이었던 것은 기말고사의 문제를 교수님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출제하고 답을 쓰는 방식이었다. 처음 이러한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출제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갔다.
시간이 흘러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서관 서가를 빙빙 돌며 이 책 저 책 들추기를 반복하며 서가에 꽂힌 책들의 제목과 목차를 한참 훑어보았다. 고민 끝에 고른 책이 강만길 선생의 저서 ‘고쳐 쓴 한국 근대사’였다. 이 책의 목차를 보니 제2장 민중경제의 향상 부분을 활용하면 ‘자본주의 맹아론’에 관한 꽤 괜찮은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불과 며칠 만에 조선 후기의 민중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을 토씨까지 달달 외웠던 것을 보면 그때는 지금과 달리 암기력이 좋았다.
시험 당일이 되어 의기양양한 가운데 시험지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식으로 답안을 적을 때 한자를 적으면 단어 하나당 점수를 올려주고 만약 한자를 잘못 적을 시에는 감점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했다. 한자를 적어서 가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에 달달 외운 답안을 깔끔하게 적을 것인가. 한자를 읽는 것은 잘해도 적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고, 잘못 적을 시에는 감점도 있으니 그냥 머릿속에 준비한 답안을 깔끔히 적어 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섰다.
그렇게 치른 시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자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다. 사학계의 거두인 강만길 선생의 저서를 토씨까지 완벽하게 외워 쓴 답안치고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성적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청했고 강만길 선생의 저서를 암기하듯 꼼꼼하게 읽었던 것은 나름의 성과였다. 이때 본 시험에 대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교수님의 기말시험은 성공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
사실 대학에 다닐 때 만해도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 영화사 공부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어찌하다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내가 쓴 학위논문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의 영화산업이 일제의 지배로 인해 식민지적으로 구조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강만길 선생 등이 지닌 문제의식에 일정하게 동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2010년 강만길 선생님의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이 출간됐다. 사학자가 쓴 자서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 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사서 읽었다. 선생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가 살아 낸 20세기를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선생은 분단 시대의 지식인으로 분단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선 분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사셨다. 얼마 전 선생의 부고 기사를 접하고 선생이 쓴 자서전을 다시 꺼내 머리말을 읽어 봤다. 일기를 쓸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로서의 아쉬움이 짙게 묻어 있다. 처음 선생의 자서전을 읽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선생의 책을 읽다 잠이 들었다. 밤새 천장을 울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쳤다.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으로 비 내린 맑은 하늘이 유독 밝은 빛을 뽐내는 듯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다.
▲한상언 영화연구소대표·영화학 박사·영화사가
- 이전글[교차로 라이프] 빵보다 술이 먼저 23.09.22
- 다음글[교차로 라이프] 손숙 "다시 태어나도…연극 배우, 그 말 하나로 족해요" 23.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